[뉴스추적] 정전협정 기념일에 드러난 김정은의 이중 행보
상세정보
【 앵커멘트 】
어제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되는 날이었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일들이 북측에서 벌어졌다고 하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연장현 기자, 어제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서 특이한 동향이 포착됐다면서요?
【 기자 】
네, 우리는 정전협정일이라고 부르지만, 북한은 전승절이라 부릅니다.
전쟁에서 미국에 승리를 거뒀다고 의미부여를 하는 건데, 그동안 정전협정일의 북측 분위기가 어땠는지 함께 보시죠.
▶ 인터뷰 : 박영식 / 당시 북한 인민무력상 (지난해)
- "아메리카 제국의 심장부에 가장 철저한 징벌의 핵 선제타격을 가하여…."
살벌했던 이 모습과는 달리 올해는 북측이 미국에 대한 공격적 발언은커녕, 오히려 정전협정일에 미군 유해를 돌려주면서 화해의 몸짓을 취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중국 마오쩌둥의 아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숨졌는데, 그 묘지를 5년 만에 다시 찾은 겁니다.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밀고당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도 있듯이, 미국은 유해송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미국은 다인종국가로서 국가 내 단결을 위해 국가주의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의 사회분위기와 교육을 바탕으로, 군인의 위상은 그야말로 최상급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군인들이 외국에서 국가를 위해 싸우다 전사했다면, 유해를 다시 모셔와 명예롭게 장례를 치르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미국 정가에서도 유해송환의 상징적 의미를 알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일종의 보여주기식 성과로도 안성맞춤인 셈이죠.
과거 베트남이 유해송환을 통해 미국과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터서, 급속 경제 성장을 이룬 선례도 있습니다.
▶ 인터뷰 : 폼페이오 / 미국 국무장관 (지난 9일)
- "베트남이 과거를 딛고 엄청나게 도약할 수 있었던 열쇠는 미국과의 새로운 관여정책 때문이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북측에 '베트남의 선례를 따라 유해송환을 시발점으로 북미관계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자'라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3 】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에게 유해송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공짜로 유해송환, 뚝딱 해줄 것 같진 않고 자신도 바라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행보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절대 서두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비핵화를 먼저 하겠다고 나설 때는 다급해 보였지만, 일이 진행될수록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 느긋한 모습인데요.
사실 이번에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해 200여 구 중 일부인 55구만 송환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북측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결국 김 위원장이 현시점에서 가장 원하는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해,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질문 4 】
김정은 위원장이 이토록 간절하게, 또 때로는 냉정하게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간단히 말해 체제보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이 애초에 먼저 비핵화를 하겠다고 국제무대로 나온 이유가, 자신의 남은 집권기간을 무리 없이 보장 받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여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로는 UN 대북제재, 또 그로 인한 궁핍한 경제상황에 따른 주민들의 소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종전선언이 되면, 이는 곧 법적인 효력을 갖는 정전협정을 끝내는 마중물이 될 거니까요.
또 정전협정이 끝남과 동시에 김 위원장이 원하는 대북제재 해제 등을 담보할 평화협정의 체결도 꿈꾸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협상의 대가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김정은 위원장이 만만찮은 협상력을 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유해송환이 종전선언, 더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의 씨앗이 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연장현 기자, 고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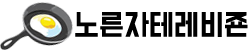



![[정치부회의] 귀순 당시 CCTV 공개…유엔사 "북 정전협정 위반"](https://i.ytimg.com/vi/6V7pcYDVfCA/mqdefault.jpg)









![[M2]송중기 과거영상 - 엘레베이터女 몰카 (부제 유시진대위님이땐이랬지말입니다)](http://s1.dmcdn.net/UDieA/x240-kra.jpg)


![[정순영의 생쇼] 미쓰비시 광고 거절한 송혜교에 일본 네티즌들 격앙된 반응 “한국 연예인 쓰지 말자!”](https://i.ytimg.com/vi/YIMnUCvFKUs/mqdefault.jpg)

